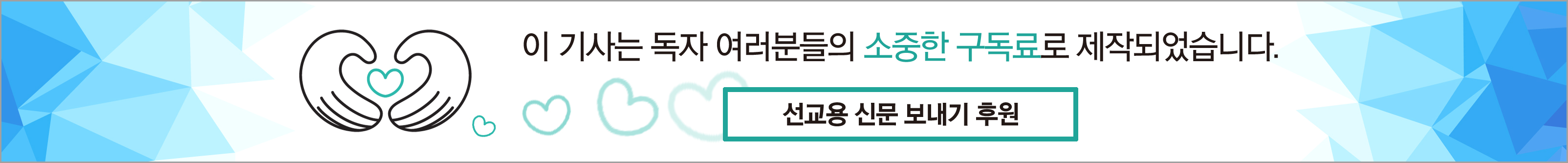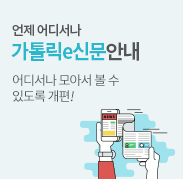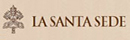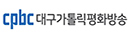1825년 멀리「로마」에 있는 천주교회의 수위권자인 로마교황에게 조선교회에 성직자를 파견해줄 것과 항구적인 대책을 특별 배려해 줄 것을 청원하는 무렵부터 정하상과 유진길은 성직자 없는 조선교회의 실질적인 평신도 지도자였다. 그들은 조선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에 바빠 밖으로 부지런히 국경을 넘나들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의 조선교회에는 1801년 신유교란 후예도 1815년의 乙亥迫害, 1827년의 丁亥迫害등 간헐적으로 각지에서 교회에 아픈 희생을 강요하는 박해의 시련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위험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교우들을 찾아 심령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신앙의 불길을 태워주었고 용기를 부축하여 주었다.
조선교구 설정의 막후주역의 일을 수행하여 조선교회를 교황대리가 사목하는 독립사목단위인 교구의 위치로 올려 놓았고 또한 모방 신부ㆍ샤스땅 신부 그리고 조선교구의 제 2대 교구장 앵베르(Imberf 范世亨) 주교를 맞이해 들여 조선교회로 하여금 주교ㆍ신부 그리고 평신도가 존재하는 교회로 발전시켰다. 이런 위훈을 세운 정하상과 유진길은 1839년 己亥敎難때 천주 대전에 신앙을 증거하고 피의 제사를 올려 영생의 승리자가 되었다. 己亥迫害가 일어나자 교회의 핵심적 지도자이던 이들은 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배교자의 밀고로 7월에 가족과 더불어 체포 투옥되었고, 혹독한 취조를 받았다. 열성적 평신도 지도자요, 성직자를 모셔들여 시종하였고 교회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기에 그들에 대한 고문은 처참하였다. 그러나 신앙과 용기로써 이 시련을 이겨냈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국에 들어온 서양 성직자들이『오직 천주의 영광을 현양하고 사람들에게 십계를 지킴으로써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영혼을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위해……화려하고 풍요한 고국을 떠나 구사일생의 험지인 이국 땅에 찾아온 사람』들 이라고 극구 변호하고 그들에게 通貨ㆍ通邑의 죄를 씌움은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대들었다.
1839년 9월 22일 저녁무렵 마침내 이들은 西少門밖 형장에서 휘강이가 내려치는 칼날 아래 목이끊겨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그때 정하상은 45세이고 유진길은 49세였다. 이들에게 충직하였고 교회의 밀사로 분골쇄신의 노력을 폈던 천주의 일꾼 趙信喆도 이들과 더불어 순교하였다.
정하상이 순교한 두달후에 그의 모친 柳召史(체칠리아)가 순교하고 다시 다음달에 그의 누이 丁淸惠(엘리사벳)가 순교하였으니 정하상 일가는 모두가 천주의 신앙을 증거하고 영생의 자리를 누렸다. 한편 유진길의 큰 아들 大喆(베드로)은 열세살의 어린 나이어서 애처롭게 여긴 주변인물로 부터 배교의 유혹을 끈질기게 받았으나 끝내 신앙을 지켜 부친이 순교한 한달후에 또 한순교 하였다. 이처럼 조선교구 설정의 막후 주역들은 그들의 활동에 부합되는 최후를 마쳐 후세의 추악을 받는 순교자가 되었다. 이들 두집안의 순교자들은 오늘날 79위 순교복자들에 끼어 한국인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
조선교구의 설정은, 교회사적으로는 조선교회가「북경」교구의 예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교황대리인 감목이 사목하는 대목교구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어 교정상(敎政上)의 독립을 이루게 된 일이기에 의의가 크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제 2의 출발을 뜻하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영향 하에서의 탈피에 따른 조선교회의 독립적 위치를 범세계적 수위권자인 로마 교황에 의해 인정받은 것이기에 조선왕국에 대한 주권적 지위의 확인이라는 의의를 지닌 일이었다.
유럽에 조선왕국과 그 교회를 인정하는 권위적 존재가 생겼다는 세계성을 띤 민족사 전개의 한 국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지닌 조선교구의 설정을 이끌어 놓은 막후 주역이 정하상이 고유진 길이었다.
이들의 발전적 청원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불과 2천여 교인에 성직자 한분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는 조선교회가 독립된 교구로 설정되는 이례적인 조치를 받았던 것이다.
교회의 수위권자인 로마 교황에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는 이들의 놀라운 발상은 이미 1801년의 순교자 황사영의「吊書」에 그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1811년에 權요한 등이 올린 로마교황에 대한 청원을 계승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러기에 丁ㆍ劉 양인의 교황에 대한 청원은 두 사람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찍이 조선천주교회 초기부터 지도적 교인들이 품고 있던 착상이고 구안에서 발전 된 것이었다. 다만 황사영의 그것은 군대를 동원한 敎宗(皇) 이름으로의 정치적 교섭에 초점이 두어졌었고, 權요한 등의 것은 성직자의 파견을 간절히 청원한데 대하여, 丁ㆍ劉의 그것은 성직자 파견만이 아니라 조선교회 발전을 위한 항구적 대책의 강구를 아울러 청원한데서 발전적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교구의 설정도 우리 선대 교회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대를 이어 전개되어 얻어진 결과이다. 천주신앙에의 도달, 한국교회의 창설의 이례적 전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이례적 교회사의 전개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끝)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