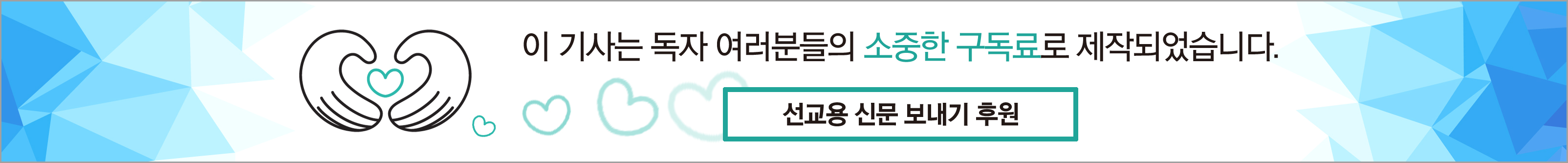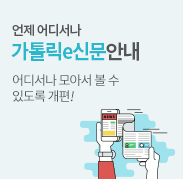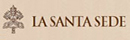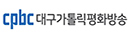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의 전복 사고 이후 대한민국은 울음바다에 빠졌다. 공교롭게도 때는 성주간, 예수님의 수난을 닮은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접하니 2013년 7월 람페두사 섬에 울려 퍼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이 떠올랐다.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다.” 배를 탄 동기는 다르지만 강론 속의 ‘이들’도 바다에서 숨져간 사람들이었기에, 잊고 있던 그 말씀이 되돌아와 가슴을 친다.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면 사람들의 이목은 TV 재난방송에 집중된다. 사고 현장과 수습 과정을 생생하고 빠르게 전달할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피해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열망을 앵커와 기자들이 대변해 주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재난방송을 보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유감스럽게도 울음을 잊은 사회의 맨얼굴이다.
방송 외적인 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불거진 지휘체계의 혼란, 빈말로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 구조 책임자들의 태도, 자막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희생자 수 집계,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말을 더듬는 간부들, 승객들을 버려둔 채 승객인 척 탈출한 일부 승무원들의 모습이 화면에 노출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방송계 안에서 문제였던 것은 과열된 취재 경쟁과 일부 방송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것을 아느냐”고 질문해 학생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사고 보험금 액수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해 전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건 직후에 불거진,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의 취재 경쟁도 논란거리였다. 경쟁논리를 내면화한 방송인들이 ‘알 권리’를 주장하는 사이,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들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었다.
진도 앞바다에서 람페두사로 돌아가서, 오늘 나는 “울음을 잊은 사회”를 다시 생각한다. 그 울음은 비극 앞에서 흘리는 한순간의 눈물만이 아니라, 약자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는 연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실천까지를 포괄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삶의 터전인 사회가 약자의 눈물을 외면할 때, 비극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신문 기사 대신 SNS에 떠도는 소문을, TV 뉴스 대신 현장의 누군가가 찍었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더 신뢰하는 대중의 행보는 사회를 믿지 못하게 된 개인들의 방어 행위다. 희생자들을 위해 울어주는 것을 선의의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사회가 울어주지 않으면, 약자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경향잡지 기자를 거쳐 미디어부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한다. 2008년 <매거진T> 비평 공모전에 당선된 뒤 <무비위크>, <10아시아> 등에 TV 비평을 썼고, 2011년에 단행본 <예능은 힘이 세다>를 냈다.
문화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