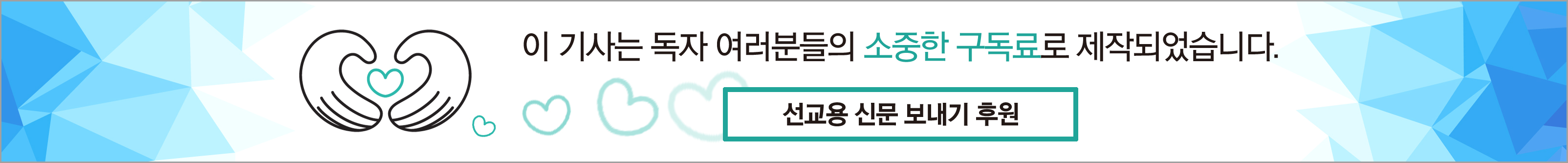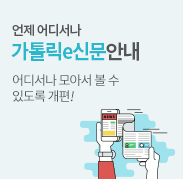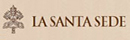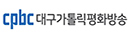요즈음 ‘먹방’(‘먹는 방송’의 준말)은 방송의 한 장르로 정착된 느낌이다. 맛집 순례는 음식점들의 홍보 수요에 힘입어 순항 중이다(‘찾아라 맛있는 TV’, ‘테이스티 로드’, 생활정보 프로그램). 식당은 사회의 양심을 검증하는 표본실이기도 하다(‘먹거리 X파일’). 요리 경연은 요리사들의 창의성과 정직한 맛내기를 강조하며 요리를 예술로 승화시킨다(‘한식대첩’, ‘냉장고를 부탁해’). 어린이들의 ‘먹방’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희망의 상징이다(‘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상차림은 느림의 미학을 보여준다(‘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한국인의 밥상’, ‘삼시세끼’).
먹음은 생존의 전제이고 원초적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다. 그래서 음식은 방송 제작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게 되는 소재다. 방송 스튜디오, 번화가의 맛집, 시골을 두루 훑는 식탐의 향연은 저마다 시청자의 특정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눈길을 붙잡으려 노력한다.
맛집 순례와 요리 경연의 시식가들 대부분은 식욕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음식이 화면에 담길 때 향과 질감과 온기는 삭제된다. 그 결핍을 보충하는 방법은 시·청각 요소를 과장하는 것이기에, 카메라는 수시로 음식을 클로즈업하고 시식가들은 음식에 탐닉하며 찬사를 늘어놓는다. 주목할 것은 방송 이후의 풍경이다. 대중이 맛집과 스타 요리사의 식당 문앞에 줄을 서는 사이, 녹화를 마친 출연자들은 매력적인 용모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다이어트를 재개한다. 극단적 절제와 무절제한 식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기는 방송인이나 시청자나 마찬가지다.
육아 예능과 ‘상차림 먹방’은 현대인이 잃어가는 가치를 환기한다. 먹거리를 매개로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아이들, 그 모습만 봐도 배부른 부모의 사랑, 공장에서 찍어낸 인스턴트 맛이 아닌 지역과 집안의 고유한 손맛, 흔한 식단에 서툰 솜씨로 지은 밥과 반찬을 나눠 먹는 친교, 순박한 시골 마을의 조건 없는 환대, 독신자의 냉장고처럼 가득 찼으나 어수선하고 헛헛한 내면을 타인이 만들어준 따스한 음식으로 위로받는 체험.
오늘날의 ‘먹방’은 결핍과 충족, 친교와 위로, 베풂과 환대의 영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러나 TV 앞에 앉은 우리는 ‘먹방의 영성’에 자극받다가도 거푸 좌절한다. 내 가족이 대가 없이 지어주는 집밥은 점점 희소한 것이 되어간다. 요리사의 철학과 시중드는 이의 정성을 담은 진수성찬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시간이 없는 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느긋하게 먹고 편히 쉬는 대신 끊임없는 욕망과 성취를 부추기는 시대에 순응하는 한, 현대인의 배고픔은 먹고 채워도 가시지 않을 것이다. 먹거리를 내세워 시청률을 다투는 방송인들도, HD 화면 속 산해진미를 뒤로하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시청자들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경향잡지 기자를 거쳐 미디어부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한다. 2008년 <매거진T> 비평 공모전에 당선된 뒤 <무비위크>, <10아시아> 등에 TV 비평을 썼고, 2011년에 단행본 <예능은 힘이 세다>를 냈다.
문화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