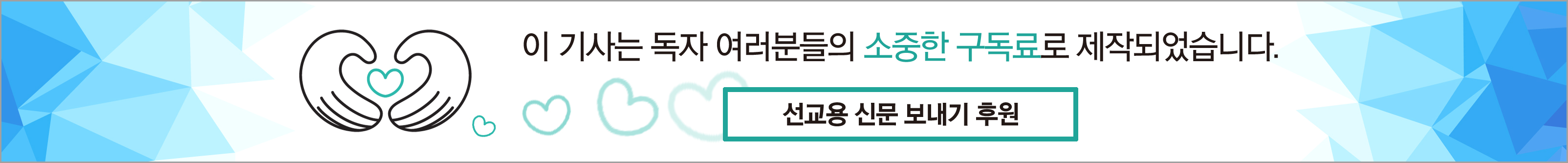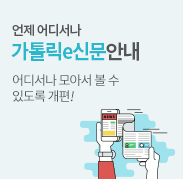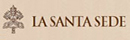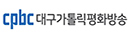모현 호스피스와의 만남

▲ 영화 ‘목숨’ 포스터.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찍는다는 것은 민감한 이야기죠. 마르고 머리가 빠진 여성 환자들은 거부감이 더욱 심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뒤따라올 분들을 위한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해 달라, 제가 잘 정리해서 지도를 전달한다면 다음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했죠.”
감독의 설득에 환자들이 촬영을 허락했다. 촬영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환자들의 일상이란 단조로웠고, 죽음의 일상을 필름에 담아야하는 괴로움은 커져만 갔다. 임종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도 힘든데,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자문이었다.
“임종을 촬영하면서 사람이라면 함께 울고 슬퍼해야하는 것이 정상인데, 촬영을 하자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촬영 후에도 편집하면서 최소 500번은 임종장면을 돌려봤을 거예요. 그동안 술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죠.”
그는 지금도 ‘기억’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자신의 영화를 본 것도 편집실이 마지막이었다. 상영관에서 볼 용기가 나질 않는다.
산티아고에서 만난 삶을 사는 법
‘죽음’을 다루려고 마음먹은 것은 2008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였다. 개인적인 고민을 안고 산티아고로 떠나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난 순례의 길은 짐과의 사투였다. 34일을 걸으며 가져온 짐을 차근차근 버렸다.
비누와 치약까지도 반씩 잘라 버리며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애썼지만, 귀국해 짐을 정리하며 한 번도 쓰지 않은 짐들을 발견했다. 순례를 떠나기 전부터 알았더라면 준비하지 않았을 짐이었다. 그때 알았다. 삶의 여정 안에서도 ‘가치 없는 짐’을 지고 사는 내내 힘겨워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후회였다.
“죽음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지향이 달라지겠죠. 현세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죽음을 보며 그는 이별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다고 했다.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마지막까지 의료행위를 택하는 것보다는, 삶의 가치를 택하며 이별의 수순을 밟는 일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박수명씨는 그런 점에 있어 감독에게 감동을 줬다. 그는 암 선고를 받고 곧바로 호스피스에 들어와 아프더라도 순간을 누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쪽을 택했다.
인터뷰 마지막에 감독은 물었다. 호스피스에 입원해 의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재워줄까, 고통을 조금 느끼지만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재워줄까, 고통은 느끼지만 깨어서 삶의 시간을 갖게 해줄까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마지막 우리의 선택은 평소 우리 삶의 태도를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