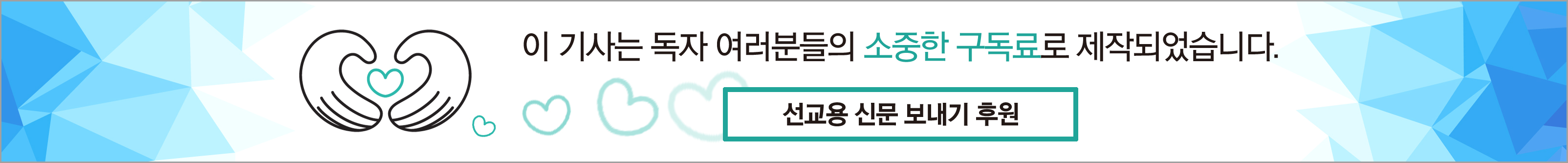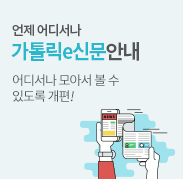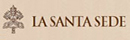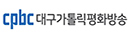우리나라만큼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100년을 버틴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 더욱이 유스티노(100?~165)는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스스로 복음을 찾았고, 평생 그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박해를 멈추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결국 제사를 거부한 죄로 순교했다. 그를 주보로 학교가 세워진 것은 바로 우연처럼 얹어진 ‘뜻’이었다.
대구교구가 설정된 후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사제양성이었다. 당시 교구에는 서상돈이 기증한 화원 종묘원 땅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 건립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드망즈 주교는 세계 각처에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그들의 아들을 바칩니다. 신학교를 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1912년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2만5000프랑이 건축을 가능케 했다. “성유스티노의 이름으로 신학교를 설립하려면 이 돈을 사용하십시오. 설립되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학교의 설계는 명동대성당을 완성시킨 프와넬 신부가 맡았다. 건축 스타일은 오늘날 보는 모습 그대로다. 이런 유형의 건물은 당대에는 물론 ‘낯선 집’이었다. 공사는 중국인 벽돌 제조업자들과 프랑스 영사관을 건축했던 책임목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대구에 중국인 거리를 형성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전쟁에 소집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학교가 완성됐다. 건물의 양쪽 날개 중 왼쪽 날개만 지어진 상태였다. 드망즈 주교는 이 건물을 사진찍고, 다 완성되면 성당이 가운데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메모해 놓았다. 신학교는 1914년 학생 59명으로 개교했다. 신학교의 오른쪽 날개 건물은 1919년에 완성됐다.
이해 성유스티노신학교 학생들도 3·1운동에 가담했다. 주동이었던 김구정과 서정도는 귀가조치 당하고 홍순일 교사는 파직됐다. 그리고 각기병이 창궐한다 하여 5월 1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이 길어진 이때 새로운 공사가 이뤄졌다. 그리하여 성유스티노신학교는 1950년대까지 경상북도에서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이 학교는 긴 세월을 따라 여러 역할을 했다. 전주·광주·부산·마산·제주교구가 이곳에서 뿌리를 찾는다. 또 1933년 광주대목구 설정을 준비하러 온 골롬바노회 신부들 10명은 이곳에서 한글과 조선 생활 풍속을 배웠다. 6·25때는 베네딕도회 수사들이 이곳에 머무르기도 했다. 신학교는 종교외적 건물로도 이용됐다. 1945년 2월 일제에 의해 폐교되고 나서 일본육군에 징발되는 아픔을 겪었다. 해방 이후에는 경찰학교, 미군부대가 차례로 진주했다. 6·25전쟁 때는 육군병원으로도 쓰였다. 이후 대건학교에서 사용했다. 그런데 1969년 대건중·고등학교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측 부분(현 신학교 학부동 위치)을 철거했다. 1990년에는 신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좌측 부분(현 신학교 본부동 위치)이 철거돼 현재 모습만 남게 됐다. 날개건물을 잃은 것이 최근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성유스티노신학교 건물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0년 12월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됐다.

▲ 드망즈 주교가 촬영한 성유스티노신학교 경당 내부 모습.
(김정숙 교수 제공)
(김정숙 교수 제공)

▲ 성유스티노신학교 경당의 현재 모습. 사라진 스테인드글라스를 새로 제작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았다.
(김정숙 교수 제공)
(김정숙 교수 제공)
100년의 역사를 지닌 성유스티노신학교는 신학교와 기념관으로 부활했다. 경당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다. 제대, 감실, 성가대석, 성당 의자, 제의장 등이 시간을 머리에 이고 있다. 1982년 개학한 선목신학대학(대구가톨릭대 전신)은 대구 봉덕동에 있다가 1991년 이곳으로 옮겨왔다. 선목신학대학이 대구대교구에 세워지게 된 것도 성유스티노신학교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다. 한편 성유스티노신학교 건물은 지난해 기념관 개관으로 외관도 옛 모습을 복원하고자 땅을 낮추고 주춧돌을 새로 세우는 등의 공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기념관은 성유스티노홀(건축관), 드망즈홀(설립자관), 앗숨홀(문서관), 옴니아홀(100주년관) 등 총 4개 홀로 구성해 100년사를 드러낸다.
과거에 미래를 얹고 새로 태어난 공간도 있다. 경당에 없어진 스테인드글라스를 새로 제작했다. 오른쪽에 과거를 돌아보는 ‘섭리의 빛’ 그리고 왼쪽에 현재와 미래의 ‘은총의 빛’을 구성했다. 제대가 이를 이어 준다. 섭리의 빛에는 강제 폐교 전까지 배출한 사제의 수 ‘67’을, 은총의 빛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 ‘33’을 구멍으로 표현했다. 두 빛 속의 67과 33의 합은 100이다. 드망즈 주교는 평소 자신 당대에 100명의 사제를 서품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스테인드글라스가 그 숫자를 채워줬다. 이제 1000명으로 향할 차례이다. 그곳에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섭리’가 있다.
성유스티노신학교 100주년 기념관 관람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오후 5시.
※문의 053-660-5100 대구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