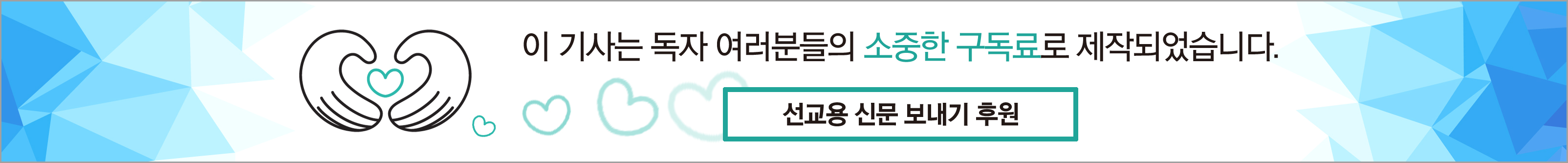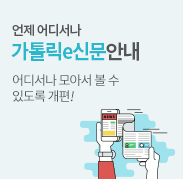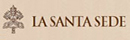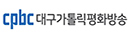교회미술의 중요성과 올바른 한국 교회미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9월 4일 서울 혜화동 혜화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마련됐다.
서울가톨릭미술가회(회장 강희덕, 담당 지영현 신부)가 연 ‘한국 교회미술 재정립을 위한 연구 세미나’는 교회미술의 역사와 맥락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미술의 새로운 길을 찾는 다양한 제안이 이어진 자리였다.
1부 ‘교회미술의 이해 전반’을 위해서는 ▲종교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 ▲교회미술과 전례(가톨릭대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 윤종식 신부), 2부 ‘한국 교회미술의 새로운 길 찾기’에서는 ▲한국 교회미술이 당면한 현실(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을 위한 예술가들의 협력(정수경 인천가톨릭대 조형예술대학 초빙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세미나를 시작한 4일부터 10일까지 혜화아트센터에서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작가 41명이 참여한 ‘세미나와 함께하는 성미술전’이 열렸다.
교회미술의 이해 전반
강희덕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서울가톨릭미술가회는 담당사제였던 장익 주교, 창립원로 회원인 최종태 교수, 교회 전례에 정통한 윤종식 신부, 교회미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정수경 교수의 연구발표가 교회미술 재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장익 주교는 발제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전경이 없이 솟아있는 뾰족한 예배당의 모습을 지적했다. 성당 과 교회 건축이 모든 본당 구성원들의 힘을 쏟아 공들여 진행하는 일이니만큼 좀 더 긴 안목으로 깊이 생각하며 진행하자는 것이다.
장 주교는 “교회공간의 모습과 느낌, 성가와 음송의 가락, 성상, 성화의 인상, 향촉의 말없는 말, 전체의 몸짓과 흐름, 교우들 간의 교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울려 신앙생활의 내용과 정서를 좌우한다“며 “이에 따라 심신으로 종교를 감득하게 됨은 기본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종식 신부는 ‘교회미술과 전례’라는 발제를 통해 미술과 전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예술가와 교회 직무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종교미술과 성미술, 전례미술 등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한 내용에 따라 나눠 설명했다. 미술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교회의 노력으로는 교구장 주교의 관심과 배려, 성미술에 조예가 깊은 사제 양성과 관계기관 설립, 신학교 내 성미술 과정 마련, 다양한 전시회 시도, 교회 문화유산 관리 등을 꼽았다.
윤 신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 인천가톨릭대학교에 조형예술대학이 생겨 그리스도교 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2008년 서울대교구 이콘연구소가 개관해 이콘 제작과 교육, 전시 등을 주도하며 조금씩 본당에서 의뢰하는 작품의 수가 늘고 있는 고무적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 교회미술의 새로운 길 찾기
최종태 교수는 한국 교회미술의 당면한 현실을 가감없이 전했다. 예술의 분야가 종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미술의 흐름이라면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각 교구마다 미술가회가 조직돼 있고 700여명이 넘는 회원전문 인력이 있지만 현재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은 기대치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복제품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예술의 향기는 비관적이라 할 만큼 미미하다”며 “교회미술은 그 시대의 신앙의 징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회언론에게 새 성당 축복식을 보도할 때 설계자와 성미술 제작자를 밝혀줄 것과 복제품 성물 노출에 대한 자제 등을 요구했다. 또, 성미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역대 교황이 전한 종교미술에 대한 메시지 실천, 창작 예술 정신의 고취 등을 제안했다.
정수경 교수는 박해시대 후 100년이 넘는 한국 가톨릭미술사에서 예술가들이 교회를 위해 협력하며 미술가협회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던 1950~1970년대를 중점적으로 돌아봤다. 1866년 한불수호조약이 체결되고 신앙의 자유를 맞아 파리외방전교회에 의해 서울 약현성당과 명동성당이 건축됐고, 성상과 14처, 스테인드글라스 등 미술품의 도입을 시작으로, 1920년대 장발의 등장이 한국 교회미술사에서 매우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동경미술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콜롬비아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장발은 1925년 귀국, 서울 명동성당 제대 뒤편의 ‘14종도’(1926), 절두산 순교기념관의 ‘김골롬바와 아녜스’(1925), 서울 가르멜 수녀원의 ‘성모영보’(1945) 등을 제작한 한국 최초의 성화가다.
특히 1954년 성모성년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미도파 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성미술 전람회’를 언급하고, 이는 서울가톨릭미술가회 발족의 초석이자 건축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들이 결속해 마련한 한국 교회미술 전람회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영향으로 새롭고 토착화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간 1960년대, 서울 가톨릭미술가회 창설(1970년 3월)과 한국 작가들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설치가 이뤄졌던 1970년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1984년)을 맞아 많은 성당들이 건축됐던 1980년대를 돌아봤다.
앞으로 교회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교회미술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훼손된 작품의 복원과 보수, 1954년 성미술 전람회를 기념하는 회고전 개최, 교회 미술품의 기록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제안했다.
문화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