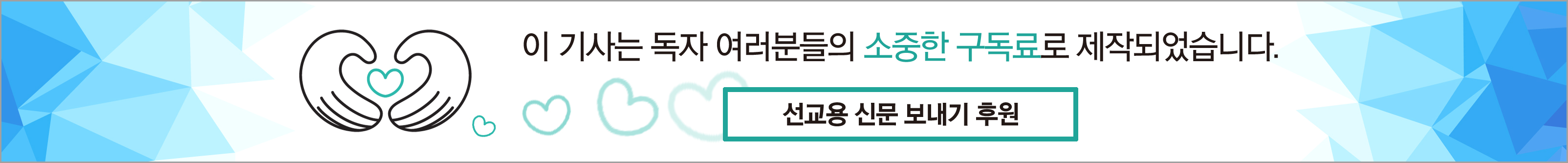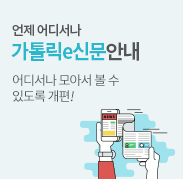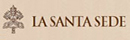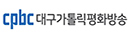조각 작품에서 종교적 메시지를 읽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동성당은 당시 고딕양식이 만연했던 가톨릭 건축물의 틀을 깬 새로운 건축물의 형태로도 유명하다. 특히 성당 정면 큰 벽면을 차지하는 대형 부조 ‘최후의 심판도’(1960)는 당시 서울대 미대 학장이었던 장발 선생의 감수로 조각가 김세중(1928~1986) 선생을 비롯한 유명작가들이 공동작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로 사자(마르코), 독수리(요한), 천사(마태오), 황소(루카) 등 네 복음사가를 상징하는 부조가 새겨져 있다. 김세중 선생 작품 특유의 단순성이 잘 드러나 있고, 엄숙하면서도 장엄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세중 선생의 작품은 수원교구 구산성지(경기도 하남)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가정과 인류의 평화를 기리는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마리아상’은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 지시봉을 들고 있다. 여성적이면서도 단호해 보이는 얼굴표정은 카리스마가 넘치며 아름다운 성지와 어우러진다.

▲ 수원교구 구산성지에 있는 김세중 선생의 성모상 작품.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빛의 아름다움’ 스테인드글라스
빛과 색유리의 조화로 환상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한국에 처음으로 서양 현대 스테인드글라스 양식을 소개한 고 이남규(루카·1931~1993) 화백의 첫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다.
약현성당 제대 뒤에 설치된 작품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중앙 창문과 양옆에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의 순교를 나타내는 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소문이 내려다보이는 성당 위치에 따라 기해박해 당시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성녀 김 골롬바와 아녜스를 작품의 소재로 선택했다.
부산 남천동주교좌성당도 빼놓을 수 없다. 건물의 한쪽 면을 이루는 푸른빛 스테인드글라스는 바다의 도시인 부산와 적절하게 어울린다.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큰 원 세 개를 중심으로 작은 형상들이 그려져 있다. 자연광이 통과될 때 성당에 내려앉는 푸른빛은 전례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45도 기울기의 커튼월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빛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양화가 조광호 신부(인천가톨릭대 조형예술대학)의 대표작이다.

▲ 부산 남천동주교좌성당 한쪽 면을 이루는 푸른빛 스테인드글라스. 조광호 신부 작품으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큰 원 세 개를 중심으로 작은 형상들이 그려져 있다.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박동석(요셉)씨 제공)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박동석(요셉)씨 제공)
아픔의 역사를 담긴 유물
수원 북수동성당 입구 오른편 종탑에 설치된 종은 1932년 심응영 폴리 신부(파리외방전교회)가 세운 고딕식 성당에 있던 종이다. 폴리 신부의 고향사람들이 구입해 보내준 종으로 1933년 서울교구장 원 라리보 주교 주례로 축복됐다.
청동으로 주조됐으며 종탑 위에서 추를 사용해 울리는 방식이다. 종 중앙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양각돼 있고, 끝자락에는 포도넝쿨이 그려져 있다. 1941년 일본이 전쟁물자 부족으로 쇠붙이를 징발했는데 폴리 신부의 지혜로 종을 수녀원 옆 헛간의 겨 속에 숨겨 전쟁물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수원 북수동성당 청동종.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영화 ‘신부수업’ 촬영지로 유명한 왜관 가실성당은 가실(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처럼 원래 아름다운 외관과 오랜 역사를 자랑해왔다. 경북 칠곡 왜관 낙동강 가에 위치한 이 성당에는 오랜 유물들이 많다. 성당 앞쪽에 위치한 성 안나상은 1924년 이전 프랑스에서 제작된, 한국에서는 유일한 안나상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성당을 급습하며 발사한 총탄자국이 왼쪽 어깨에 남아있다. 성당과 구 사제관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다.

▲ 영화 ‘신부수업’ 촬영지로 유명한 경북 왜관 가실성당.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가톨릭신문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