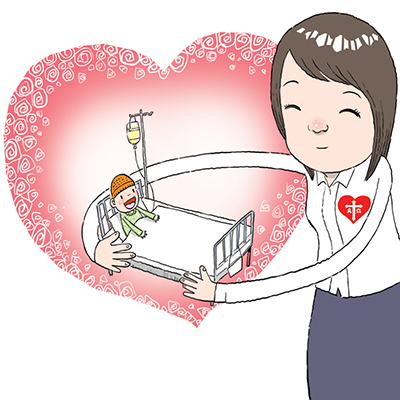의학의 기원과 발전이 그러하듯이, 의사와 병원의 시작 역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병원, 즉 환자를 받아들여서 회복할 때까지 보살펴주는 종합병원은 16세기에 와서야 등장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을 호스피탈(hospital)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가톨릭교회, 특별히 수도회가 실천해온 ‘환대(hospitality)’에서 나온 말이었다.
실제로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많은 수도회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 대한 환대의 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수도원이 자리 잡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빵을 나누는가 하면, 수도원의 몇 개의 방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 언제나 남겨두었다. 병자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가 하면, 병자들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원을 열어놓기도 했다. 병자들을 환대(hospitality)하던 수도원의 시설이 종합병원(hospital)로 바뀌게 된 것이다.
더 나가서, 많은 수도자들은 나병이나 페스트 같은 무서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병자들과 동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는 나병 때문에 “저주받은 섬”이라고 불리던 몰로카이에 기꺼이 들어가서 나병환자들의 삶에 동반했다. 자기 자신도 나병으로 고통 받았지만 몰로카이 섬을 떠나지 않았다.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실천해온 환대란 단순히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선다. 즉,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참다운 환대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빵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공간을 비워 내어주고, 시설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아픈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연민에서 시작하여, 가난한 이웃을 받아들이는 환대로,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동반하고 그들의 처지를 변호하는 연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사랑의 최고 형태는 약자와 맺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삶에 힘겨워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로 따지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여개 나라 가운데 꼴찌에 가깝다.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전에,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르 6,37) 하신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딪히는 구체적인 곤경에 대처하는 연대성의 작은 일상적 행위도 의미합니다. 이는 어쩌다가 베푸는 자선 행위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재화 독점을 극복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전제로 합니다.”(「복음의 기쁨」, 188항)
[사회교리 아카데미] 환대와 연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에서 연대까지
경제적으로 풍요한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복지는 최하위
400만 명 복지 사각지대 놓여
그리스도 사랑실천으로 해결
발행일2016-02-21 [제298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