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맑은 오월 성모님의 달이 지나고, 아드님 성심의 달이 시작한 지도 꽤 지났습니다. 신학교의 방학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지요. 이맘때가 되면 다른 분들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좋겠다고 부러워들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방학이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어요.” 반쯤은 진심을 담아 대답하지요. 학생들보다 오히려 선생이 방학을 더 기다린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그래도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이나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는 신자분들에 비하면 훨씬 편안한 생활이지만, ‘제 코가 석자’라고, 학기말이 되어가면서 점점 더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신의 피로보다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함께 지내는 신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그리고 이 미안함의 가장 큰 몫은, 특별히 전례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지내면서는 제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성자로서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신학원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례 생활이 있지요. 그런데 몸이 피로해서 아침기도는 함께하지 못하고 미사시간에만 겨우 맞추어 나가는 날들이 이번 학기에 특히 많았습니다. 또 저녁기도 시간에도 신학교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방에 있으면서도 강의 준비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날들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안함을 넘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상황에 불평하면서 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군 기도시간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나? 나도 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런 걸 어떡해!’
지난 학기 말, 어느 아침미사 때의 일입니다. 이미 그때부터도 슬슬 아침기도에 못 나가는 날이 많아지던 때였죠. 미사 중에 복음 봉독 시간이 되어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루카 10,21)라는 복음 첫 구절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뭘까?’ 이내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심술 아닌 심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이렇게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뭐가 좋으시다고 혼자 즐거워하시는 건가?’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성찰하면서, 저는 다시금 제가 ‘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교 소임 중에 하는 많은 일들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신학생 생활지도도 그렇거니와 강의나 기타 외부에서 맡게 되는 일도 모두, 제가 하고는 있지만 저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일하는 것이 힘에 부치고 그래서 일에 대한 걱정, 불안이 계속 쌓여갔던 것이죠.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 일인 것 마냥 해나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난 학기보다 더 바쁘게, 힘들게 지냈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더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지내는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중심으로 지내는 제 모습을 두고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다가오는 마음이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이니까 이 마음부터 돌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마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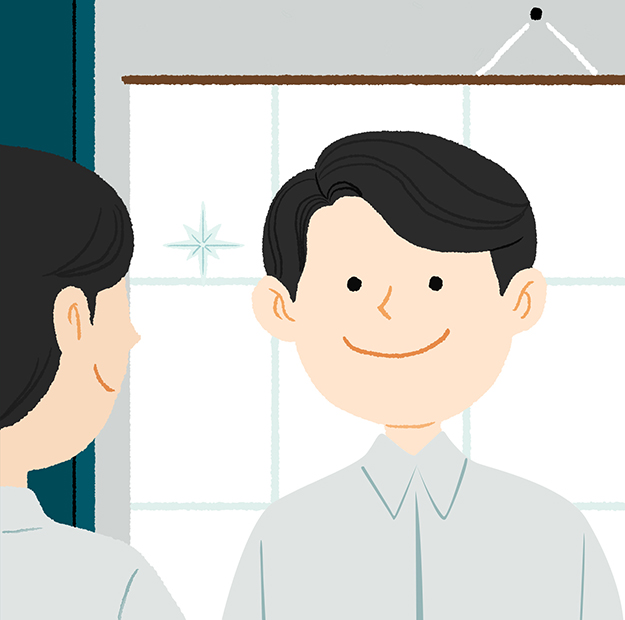
사실 두 마음 중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양성자로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죠.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늘 일에 쫓겨 사는 스스로의 능력 부족에 대한 자책입니다. ‘기도시간에 나가야지’ 다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제 의지의 나약함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뒤이어 오는 것은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입니다. ‘이럴 거면서 왜 거절을 못 했을까?’ ‘이렇게 살면서 무슨 기도생활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나?’ ‘나도 잘 못 들어가는데, 어쩌다 기도에 못 나오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제 자신을 비난하고 죄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이런 마음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마음이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뭐 내 일 하려고 그러나? 이게 다 교회의 일이지!’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다시는 새로운 일 맡나 봐라. 다 거절해야지.’ 마음의 문을 닫아걸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다.’ 하면서 양성자의 책임을 놓아버릴 수도 있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저에게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비록 제 자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저에게 저는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 일이 있는 데도 피곤해서 잠시 눕고 싶어 하는 모습, 전례생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 걱정 때문에 매번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고, 이 안에는 인간의 당연한 몸의 원리, 정신/마음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처럼 그런 근본적인 자기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원리는 원리대로 있지만, 그 원리를 따를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기지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죄스러움에 빠져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허우적거리거나 그 반대로 상황이나 다른 이를 탓하는 비뚤어진 모습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자기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 자기지향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나가면 그만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 안에는 근본적인 나 중심의 욕구가 있지만 이런 자기지향성 자체와 죄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너 중심’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민범식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영성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2003년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로마 그레고리오대학에서 영성신학 박사와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