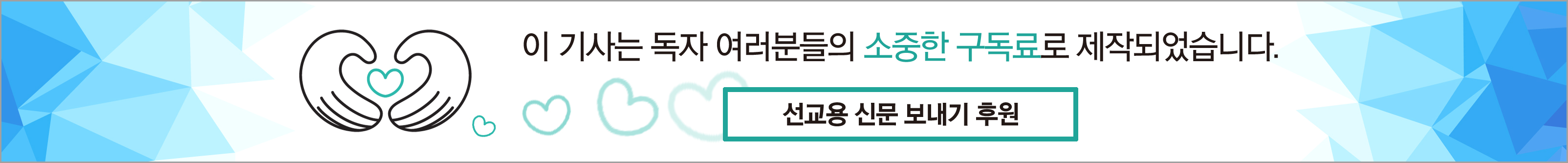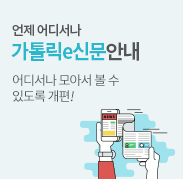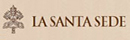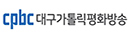곽거병이라는 중국 한나라 무제 시절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군 위청의 조카였습니다. 당시까지 중국은 북방의 흉노족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는데, 위청과 곽거병은 흉노를 물리치는 북벌 전쟁의 양대 기둥이 되지요. 한 무제는 재주가 많을 뿐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곽거병이 꼭 자기 같다며 아주 총애해서, 궁궐에 불러다 곁에 놓고 키웠지요. 신중한 위청이 머뭇거릴 때 곽거병은 서슴없이 진군해서 큰 공로를 세우곤 합니다. 곽거병은 그래서 삼촌인 위청만은 무척 존경했지만, 그 밖에는 세상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무제가 한 신하에게 곽거병을 두고 평을 해 보라고 하자, 그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날카로우면 쓰기에 편하지만, 칼을 너무 날카롭게 갈면 또한 부러지기 쉽습니다.”
훗날 곽거병은 위청을 모욕한 한 하급 장수를 사사로이 죽였으나, 그를 아낀 무제는 그를 국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변방으로 일시 몸을 피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곽거병은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병으로 급사합니다. 무제는 씁쓸하게 이 날카로운 칼의 비유를 떠올리지요. 곽거병이 겨우 23살 때 일입니다. 임금이 장수를 너무 총애해서 급하게 쓰려고 한 탓에 결국 일찍 부러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위청은 죽을 때까지 무제가 의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위청은 본래 무제의 누님인 공주를 모시는 천한 수레꾼이었으나, 공주의 추천으로 궁궐의 말을 돌보는 자리에 들어간 뒤 점차 무제의 눈에 띄어 대장군이 되지요. 그리고 청상과부로서 그를 연모하던 공주와 결국 혼인하게 됩니다. 곧 무제의 매형이 된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노래를 부르는 노비이던 그의 동생은 무제의 아들을 낳은 위황후가 됐지요. 이렇게 황제와 겹사돈이 된 그를 그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노예 시절을 잊지 않고, 신분을 으스대는 귀족들 사이에서 늘 조심스레 처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젊을 적 어렵게 살던 시절의 밑바닥 사회 경험으로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청이 흉노의 왕을 죽인 큰 공로를 세우고 돌아왔을 때 곽거병 부대는 큰 상을 받았지만, 위청 부대는 전사자 수가 많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상을 못 받았습니다. 부인이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자 위청은 부인을 꾸짖었고, 무리한 작전 중에 죽은 장군의 아들이 찾아와 칼을 빼어들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도 다만 칼만 빼앗고 내보냅니다. 그는 전쟁의 비참함과 전사자 가족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곽거병은 어릴 적에 이미 대장군의 집안사람으로 큰데다가, 황제의 큰 총애를 받아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이뤄지는 세상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스타 크래프트 게임 같은 것이었지요.
요즘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아니 중산층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의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섞여 사는 법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더구나 담장까지 치는 이들도 있다지요? 아이들 교육과 장래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왜 굳이 서로 다른 사회계층이 섞여 살 수 밖에 없게 강제로 도시구조를 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다양함과 복잡함을 알아야만 굳이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하고, 느끼며, 이룰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랜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인간들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갑자기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의견,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릅니다. 다만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가 그가 아는 유일한 해결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자연과 인간의 교류와 친화가 강조되면서 자녀를 위한 자연 학습이 여러 가지로 크게 유행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웃과도 벽을 치고 사는 인간이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에는 어떻게 사랑과 조화, 일치를 느낄까요? 혹시 우리는 그저 이 자연 또한 남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독차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녀를 날카로우나 부러지기 쉬운 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무디긴 해도 굳세어서 결코 부러지지 않는 장검으로 단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