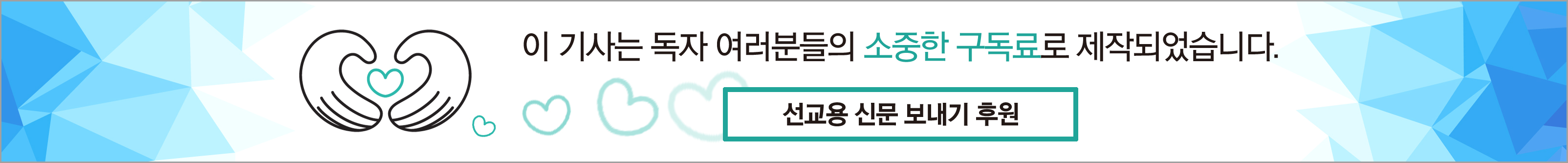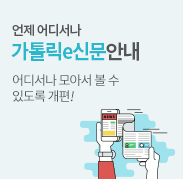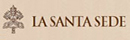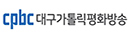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0년전 비극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피해였다. 한국군을 포함 18만여 명의 유엔군이 생명을 잃었다. 남쪽 민간인 희생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북한은 또 전쟁기간 동안 8만 5000명의 지도층 인사들을 북으로 압송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 신앙을 증거하다가 희생되거나, 북쪽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긴 신앙인들이다. 성직자 수도자도 많다. 한국전쟁 전후 북한군에 체포된 성직자와 수도자, 신학생 수는 확인된 사실만 덕원·함흥, 평양, 서울, 춘천, 대전, 광주 등을 포함해 150여 명에 이른다. 조사와 관심이 구체화 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국전쟁은 그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초기부터 면면히 내려오던 순교정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현대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물론 주교회의와 일부 수도회에서 자체적으로 현대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예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 베네딕토 왜관수도원에서 ‘신상원·김치호와 동료순교자 38위 시복시성을 위한 예비심사 법정’이 개정됐다.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도 2009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한국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각 교구에 공문을 발송,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다수 신앙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늦었다. 이제라도 한국전쟁을 종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당시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각 교구 차원의 기도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과 미래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다.
물론 역사를 과대 포장하거나 왜곡해 순교자들을 영웅화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 미래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작업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전쟁 당시 종교적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