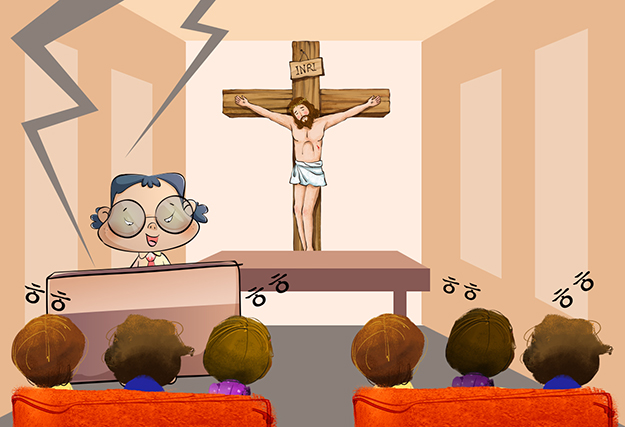
이 카타리나
성당에서 반주봉사를 하는 나는 참 독특한 경험들이 많다. 그중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꼭 떠오르는 미사가 하나 있다. 갑자기 오전 중에 수녀님의 급한 연락을 받은 그날은,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수녀님은 장례미사가 있는데 도저히 반주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반주를 부탁한다고 하셨다. 자칭 타칭 성당의 ‘경조사 전문 땜빵(?)’ 반주자였던 나는 태풍을 뚫고 천둥 번개를 가르며 성당에 도착했다.
그날의 미사는 굉장히 슬픈 미사였다. 고인의 사연도 너무 슬펐고, 유가족들의 사연도 너무 안타까워서 강론을 하시던 신부님조차 강론을 하시다 울컥하실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따라 하늘은 태풍으로 인해 유난히 어두웠고 햇살 한 줌 들지 않았다. 보이는 빛이라고는 간간히 치는 번개뿐이었다.
고요하고 엄숙한 가운데 나는 늘 그렇듯 잔잔하게 반주를 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고별식을 마치면 늘 성가 229번을 부르며 가족들이 초를 들고 관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이 성가는 2절까지 부르는데, “하늘의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마지막 숨을 고이 거두셨도다”라는 가사로 성가가 끝이 난다. 음도 슬픈 데다가 가사까지 슬퍼서인지 이 성가를 부를 때쯤에는 온 성당이 눈물바다가 되어있다.
이날도 언제나처럼 성가 229번을 쳤고 신자들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성가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을 때 일이 벌어졌다. “마지막 숨을 고이 거두셨도…”까지 불렀을 때 바깥에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천둥과 벼락이 떨어졌고 그 엄청난 천둥소리에 주차해둔 차들에서 경보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천둥소리와 벼락에 영향을 받은 것은 자동차뿐이 아니었다. 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르간에 갑자기 스파크가 튀었고 순간적으로 벼락을 맞은 오르간에서는 “빠아아앙!” 하는 소리가 났다.
내가 재빨리 오르간의 전원을 끄고 신자 석을 살짝 보니 모두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잊은 채로 멀뚱하게 오르간만 바라보고 있었다. 탄 냄새가 나는 오르간을 바라보며 신부님도, 상주분들도, 그리고 나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때 또다시 번개가 쳤다. 그 순간 상주분이 웃기 시작하셨다. 웃음은 빠르게 전염이 되었고 다들 장례미사라 크게 웃지도 못한 채 숨죽여 웃기 시작했다. 무반주로 퇴장성가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다들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미사가 끝나니 비가 잠시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것을 하느님이 그 가족에게 주신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너희 앞길을 웃음으로 햇살로 밝게 이끌어 줄 테니 힘내라는 메시지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천둥과 번개가 치면 그날을 떠올린다. 그리고 날씨가 맑아졌다며 신나하던, 상주였던 그 아이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던 그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도 생각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