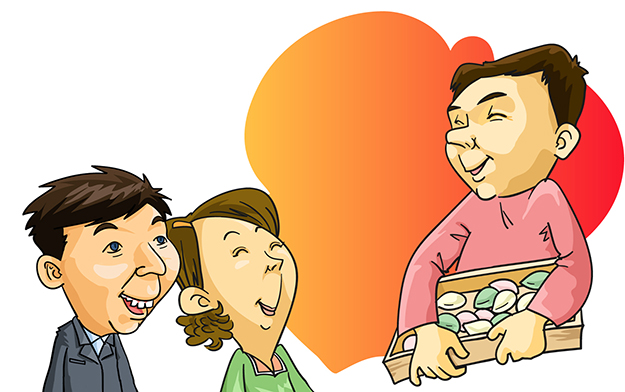
자전거를 타고 오는 중년의 남자를 흘낏 바라본다. 마르티노가 떠오른다. 지나가는 모습을 눈길이 따라간다. ‘뭐가 급해서, 그리 빨리 가세요.’
훤칠하게 잘 생기지도 않았다. 둥글넓적한 얼굴에 웃으면 살짝 벌어진 앞니가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느릿느릿 말을 걸었을 때,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퇴직하고 성당 앞 떡집을 인수했다는 마르티노가 우리 단체에 들어왔다.
그 무렵 우리는 늘 자금이 모자라 몇 년째 애면글면하고 있었다. 마르티노가 불쑥 지난 십 년간 회비라며 뭉칫돈을 내놓았다. 놀랐지만, 얼른 받았다. 얼마 후에는 떡을 후원했다. 쑥떡은 물을 많이 넣었는지 잘못 쪘는지 비틀비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두 달이 지나자 걱정과 달리 제대로 된 떡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르티노의 떡은 맛이 좋아서 성당 어르신들이 납품받아 판매하는 떡이 되었고, 각 단체에서 즐겨 주문하는 떡이 되었다.
“6만 원인데, 5만 원만 주세요.”
더운 여름, 흐르는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늘 주문한 떡 외에 봉지에 이런저런 떡을 담아왔다. 봉사하러 가면서 먹으라고 차에 넣어주기도 하고, 마치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주기도 했다. 한번은 지나가는 나를 부르더니 줄 게 있다며 황급히 달려간다. 차 안은 CD 상자가 엎질러져 엉망이었다. 동생 신부님이 낸 음반이란다. CD는 우리 집 전축이 문제인지 잘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도 고마웠다.
남편이 구역장을 오래 해서 후임을 찾았다. 마르티노가 옆 동으로 집을 옮겼다기에 부탁해 봤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하라면 해야지요.” 그날, 마르티노는 이사한 이유를 말해줬다. 그에게는 지체장애 딸이 있었다. 성장한 딸은 체격이 커지면서 아빠가 아니고서는 돌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기를 여러 차례, 수없이 머리를 조아려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일층으로 이사 왔더니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다고 했다. 덤덤하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 어둡고 찌든 그늘은 없었다.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아프다던 마르티노가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몇 달의 투병 생활.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았던 그의 영면 소식을 지난 주말에 들었다.
이사 간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연도 가는 길, 한 친구가 간밤에 마르티노가 생각나서 울었다 하자 나도, 나도, 슬며시 고백한다. 실상 마르티노랑 마주 앉아 차 한 잔, 밥 한 끼 나눈 사람도 거기에는 없었다. 무엇이 우리를 울게 한 걸까.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가 누구랑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싫은 말을 하는 것도, 남의 험담을 하는 것도. 늘 선한 미소를 띤 모습만 떠오르는 게 나만이 아니었나 보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날, 마르티노를 보내며 우리는 저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전에 마르티노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줬다. 하지만 그가 준 선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문득문득 그를 본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그를 떠올릴지 모른다. 월요일 새벽에 삼우 연도가 있다. 그의 미소를 떠올리며 이별하려 한다.
윤선경(수산나·대전 전민동본당) 명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