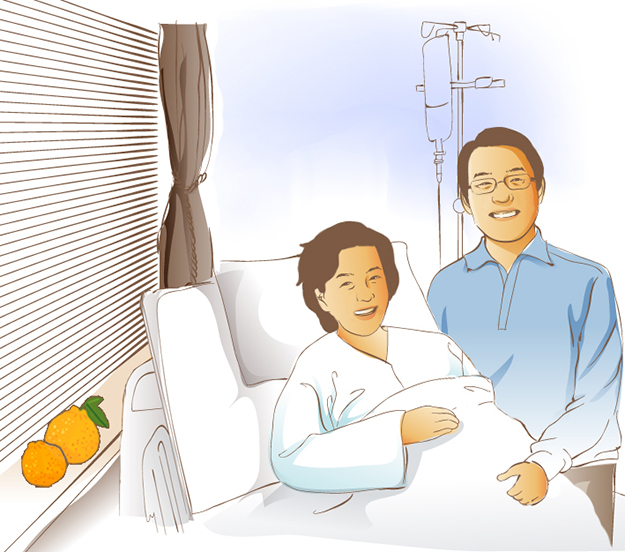
입원하는 날은 1인실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내긴 편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첫날부터 2인실에 배정됐다. 잘된 일이다.
병실 창가 쪽 침대에 먼저 입원한 여자가 있었다. 병구완하는 남편이 간이침대에 누워 있다가 나를 보더니 얼른 몸을 일으킨다. 불편해진 나는 입구 쪽에 짐을 풀고 커튼으로 침대 주위를 꼼꼼하게 가렸다.
수술 전날 밤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자정부터 금식이니 병원에서 나온 저녁밥을 먹어도 된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옆 침대 부부는 사이좋게 밥을 나누어 먹는다. 남편 목소리가 활달하고 씩씩하다. 입원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왔더니 기다렸다는 듯 여자가 황급히 들어간다. 내가 나오기를 기다린 눈치다. 남편도 따라 들어간다. 소변량을 점검해 기록하는 것 같았다. 여자는 이삼십 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더니, 그예 앓기 시작했다. 불편해할까 봐 나는 침대에서 숨을 죽였다.
들리는 소리가 심상찮다. 간호사가 왔다. 열을 재더니 얼음 팩을 가져온다. 그녀는 밤새 앓았다. 옆 침대에 누운 나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병실 화장실을 포기하고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잠을 잘 수 없으니 병실을 옮겨야 하나, 생각이 잠깐 스쳐 갔다.
“괜찮으세요? 좀 어떠세요?” 걱정된 나는 다음 날 아침 커튼을 걷고 나와 그녀에게 물었다. 열이 내려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여자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무슨 수술을 하셨기에 이렇게 안 좋으세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류머티즘이에요.” 남편이 말하더니, 작은 소리로 덧붙인다. “루푸스.” 눈가가 붉어 보였다. 입원한 지 보름째라 했다. 면역 질환이라 염증이 사방으로 옮겨 다닌다. 어쩐지 이비인후과, 피부과, 여러 의사가 오갔다.
“저는 오늘 수술해요” 하니까, 여자는 부러운 듯 말했다. “수술하는 분들은 모두 나아서 퇴원하시잖아요.” 세상에, 수술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다니! 입원하고 퇴원하는 모습을 그녀는 계속 지켜봤구나. 나에게 힘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
“화장실 편하게 쓰세요. 저는 바깥 화장실 쓰면 돼요.” 할 말이 없어진 나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지인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에 한라봉이 있었다. 두 개를 꺼내 옆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가에 올려놓았다. 병실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 음식에도 공기에도 냄새가 배어 있어서 오래 있으면 아프지 않은 사람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병실에 돌아온 그녀가 창가에 놓인 샛노란 과일을 보더니, “여보, 나 한라봉 먹을래” 한다. 목소리에 생기가 돈다.
다음 날 아침 무심결에 커피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의 남편이 커피 마시러 가는 길이라며 사다주겠다 한다. 맛있게 얻어 마셨다. 그녀가 샤워하고 나오자,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 지켜보는 나는 아픈 사람도, 병구완하는 사람도 안타깝기만 했다.
사흘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두 사람이 계속 화장실을 드나들었으니까. 그래도 첫날에는 커튼 속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새 커튼을 걷고 나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몇 살인지, 손자가 몇 명인지도 아는 사이가 됐다.
퇴원하는 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병실을 나오다가 돌아서서 나는 이름을 물었다. 남편은 천천히 한 음절씩 아내의 이름을 말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 밖에는.
■ 가톨릭신문 명예기자들이 삶과 신앙 속에서 얻은 묵상거리를 독자들과 나눕니다.
윤선경(수산나) 명예기자




























